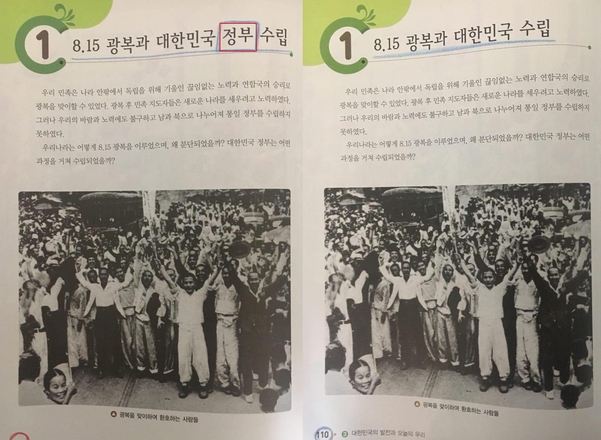한국 현대사 교육의 '뼈대'를 바꾸려는 野心 드러내
제주 4·3사건 등 재해석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시켜
北 인권 억압 등 가르치지 않아 '自國史 교육' 기본 목적 배신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선거가 실시된 38도선 이남임을 밝히는 부분과
한반도에 수립된 두 개의 정부 중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고(故) 리영희 교수가 1991년 각각 별개의 사실을 말하는 두 부분을 슬쩍 연결해
대한민국 정부가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처음 번역했다.
그의 오역(誤譯)은 금방 밝혀졌지만 본인은 끝내 정정하지 않았다.
이 주장은 일부 한국 현대사 전공 학자들의 고집으로 몇몇 검인정 교과서에도 들어갔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거부했던 해당 필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뒤 별 움직임이 없었다.
이 중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조차 올 2월 국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체불명인 '학회 추천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이라며 불사신(不死神)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꼼꼼히 보면 이번 사태가 2011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확인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가 어떤 표현을 넣고 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의 골격이었던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이란 관점을 흔들고 '분단 체제의 형성과 극복'이란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다. 원로 좌파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의 '분단 극복 사관(史觀)'이 교과서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제까지 기존 교과서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들을 공격하는 데 힘썼던 좌파 역사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틈타 아예 현대사 교육의 뼈대를 바꾸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분단 극복 사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상을 상대화해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새 중·고교 교육과정은 한국 현대사를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노력'으로 시작하고 좌우 합작,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움직임을 학습 요소로 제시한다. 이를 무릅쓰고 출범한 대한민국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학생들은 제주 4·3 사건이 '최초의 통일 시도'였다고 배울 수도 있다.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란 단원에서 '남한의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은 남북한이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정권 세습' '북한 주민 인권 억압' '북한 경제정책 실패' 등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북한의 역사적 실상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의 개악(改惡)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서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나면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1년에도 좌파 역사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반공(反共)과 남북 대립을 강조하기 위해 썼던 용어라며 사용을 극력 반대했다. 진보 헌법학자들도 서독 기본법의 강한 반공주의가 스며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거부감을 보여 왔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변화를 이용해 이런 주장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사(自國史) 교육의 기본 목적은 자기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다. 지금 진행 중인 새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 왜곡과 외면을 통해 '반(反)대한민국'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자유민주주의 등이 삭제된) 집필 기준 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식언(食言)이었는지 아닌지는, 곧 교육부의 심의 절차에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