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7 03:00
'우리집'의 비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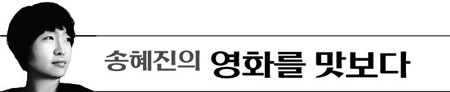
하나는 뭘 좀 아는 아이임에 틀림없다.
22일 개봉한 영화 '우리집'(감독 윤가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인 주인공 하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부닥칠 때면 무작정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볼 땐 달걀찜을 하고,
동네에서 마주친 동생 유미·유진이가 외롭고 쓸쓸해 보일 땐 수박을 잘라 화채를 만든다.
그러고선 말한다. "밥 먹자"고.
아이의 말은 뜻밖에도 힘이 꽤 세서, 목소리를 높이던 어른들도 머쓱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게 되고,
한숨짓던 동생도 일단 숟가락부터 쥐게 된다.
먹다 보면 그렁그렁했던 눈물이 쑥 들어가고, 목울대까지 차올랐던 화도 가라앉는다.
숟가락을 달각달각 부딪치고, 물을 꿀꺽 삼키면서, 그렇게 심각했던 일들도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도 그러나 결국엔 어린아이다.
정말 일이 안 풀릴 땐 하나도 풀이 죽는다.
도시락을 싸놓으면 뭐 하고,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할까.
"밥 먹자"는 자신의 말을 어른들이 외면할 때,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엉키기만 할 때,
하나도 입술만 깨물 수밖에 없다.
좋아하는 동생 유미와 유진이가 집에 놀러와서 "언니 집 참 좋다"고 말할 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우리 집은 겉보기엔 좋지만, 속으론 곪아터졌어….' 이런 말을 속으로 삼키며 하나가 내놓는 게 비빔면이다.
삶은 라면에 양념장을 비비고, 반숙 달걀 몇 개를 얹은 한 그릇.
만들기 어렵진 않았겠으나, 열한 살 아이로선 자기 나름의 최선과 정성을 다해 완성했을 음식.
열 살 유미는 비빔면을 먹으며 하나의 눈을 바라본다.
'언니, 내가 다 들어줄게' 같은 말이 담긴 표정으로.
아이들이 비빔면을
먹는 거실엔 때마침 오후 햇살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던가.
유난히 머릿속이 어지럽고 복잡했던 날, 문득 이 장면이 생각났다.
비빔면을 꺼내 삶은 면을 찬물에 헹궈내고 시판 양념장에 쓱쓱 비빈 다음,
내 나름대로 열무김치와 달걀 반숙까지 얹고 나선, 식탁에 앉아 달음박질을 치듯 한 그릇을 후루룩 비웠다.
맵고 달고 속 시원한 맛. 머릿속도 덩달아 말끔해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