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13 03:03

디자이너들끼리 암묵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있다.
유니폼 의뢰를 받았다는 걸 외부에 드러내지 말 것.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정형화된 제복을 제작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일부러 숨기는 이들이 있단다. '힙(hip)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아했다. '다른 직업군의 삶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왜 마다하지?'
예전 유명 은행에서 유니폼을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예전 유명 은행에서 유니폼을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평소 내게 은행은 돈을 찾고 맡기는 업무의 공간 이상이었다.
빠른 손놀림의 직원들이 수백 가지의 서식과 수십 종류의 도장을 착오 없이 처리해낼 때의 경이로움!
마치 서로 다른 원단을 오차 없이 재단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디자이너들의 스케치 속 그들만 알아보는 디테일 차이처럼, 암호 같은 전문용어들은 신뢰감을 증폭시켰다.
직원들은 '차르르르' 하며 돈 세는 기계를 비롯한 각종 사무기기가 내는 소리는
재봉틀이 '드르르륵' 대는 것을 연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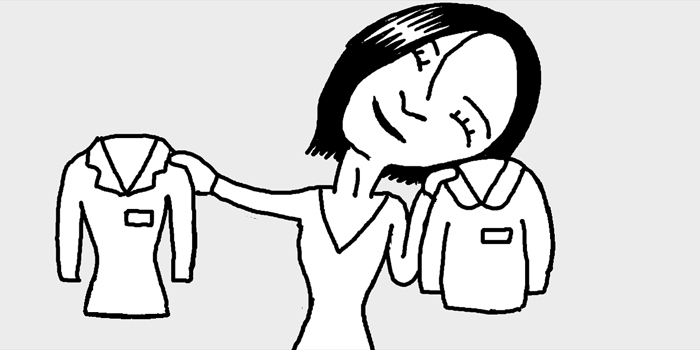
유니폼을 디자인할 그 은행에서 일주일 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직원들과 함께 보냈다.
'놀이터'같이 찾았던 그 공간을 공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각보다 손님과 직원과의 거리가 무척 가까웠다.
전문직 중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가장 많이 포함된 듯하다.
그럴수록 친근함은 강조돼야 했다.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목선 'V존'에 신경을 썼다.
조명이 얼굴 바로 위쪽에 달려 그늘이 지기에 환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손목을 워낙 많이 써 때가 타기 쉬우니 손목 쪽을 보완했다.
직원들이 이동할 때 고객이 주로 보는 건 뒷모습이었기에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뒤쪽 라인을 디자인했다.
옷을 디자인하러 왔지만 삶을 디자인하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다.
특정 직업을 위한 옷은 생활하는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유니폼의 기능은 소속감에 집중돼 있는 듯하다.
단순히 그 직장에서 입는 옷이 아니다.
특히나 대중을 상대하는 업무라면 옷 하나로 그 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공공 디자인'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