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2 03:03
[99] 동계 정온이 살았던 거창과 양민 학살 사건
병자호란 항복을 반대한 동계 정온의 고향
사당 문에는 그가 할복한 해를 적은 '입춘대길' 문구
수승대에는 거창 신씨, 은진 임씨 가문 바위 소유권 놓고 다툰 길고 긴 갈등의 상처
눈길 닿는 곳마다 6·25전쟁 와중에 719명 양민 학살당한 아픔의 흔적들
'땅은 반드시 역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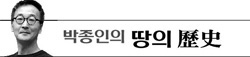
망각은 서럽다. 무관심은 두렵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일기를 쓰고 맑은 가슴으로 옛일을 추억한다. 추억이 기억이 된다. 기억이 모여 역사가 된다. 경상남도 거창에서 만난, 추억 혹은 역사 이야기다.
기억 1 - 동계 고택 입춘방(立春榜)
동계(桐溪) 정온(鄭蘊·1569~1641)은 거창 위천 사람이다. 당색을 따지자면 대북파였는데, 당색과 무관하게 바른말을 잘했다. 그래서 대북파가 여당이던 광해군 때도 제주도 귀양 생활을 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이 되었다. 서인을 등에 업은 반정인지라, 인조는 서인에 꼼짝 못 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는 결국 청나라에 항복했다. 현실주의 정당인 대북파 소속이지만, 서인 편을 들어 정온은 항복을 반대했다. 1637년 2월 24일 인조가 성문을 나서는 순간 정온이 칼로 자기 배를 찔렀다.

칼날은 2촌(寸), 6㎝까지 들어갔다. 예순여덟 살이니, 기력이 충분치 못했다. 튀어나온 창자를 아들이 쑤셔 넣고 배를 꿰맸다. 기사회생한 정온은 아들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꼬장꼬장한 집안에서 이리 말하는 것이었다. '칼을 꺼냈으면 죽어야지 어찌 살아왔는가.' 하여 정온은 피폐한 몸을 일으켜 뒷산으로 들어갔다. 어디 갔냐 물으면 '아무 데나'라 했다. 비둘기 둥지 같은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모리(某里)라 했다. '아무 데나'라는 뜻이다.
이러저러한 충절이 인정돼서 훗날 1764년 영조는 정온 후손에게 불천위 제사를 허용했다. 5대가 지나도 영원토록 제사를 지낼 지위다. 불천위 사당은 위천마을 동계 고택 안채 뒤편에 있다.
해마다 봄이면 대문에는 입춘방(立春榜)이 붙는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며 건양다경(建陽多慶) 같은, 세상에 봄을 축하하는 문구다. 정온 사당 입춘방은 특이하다. 오른쪽 문에 '立春大吉'이라 붙어 있고 왼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敢告崇禎丁丑後三百七十九年立春(감고숭정정축후삼백칠십구년입춘).' "숭정 정축년 후 379년째 봄임을 감히 알리나이다."
숭정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연호다. 사대(事大)에 몰두했던 노론당이, 사라지고 없는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용했던 연호다. 대개 '숭정 기원 후'라 쓴다. 그런데 이 사당 대문에는 '숭정 정축 후'라 적혀 있다. 심상치 않다.
정온이 배를 칼로 찌른 1637년이 숭정 정축년이다. 남들이 쓰니까 숭정 연호를 빌리되, 이 고택의 봄은 숭정 기원이 아니라 숭정 10년째 되는 1637년에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해마다 입춘방을 쓰면서 사당 주인의 배짱과 기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니, 이 입춘방 하나만 읽어도 거창 여행은 뜻깊다.
기억 2 - 수승대 바위에 새긴 욕심
동계가 살았던 위천마을 옆에 위천이 흐른다. 위천에는 큰 바위가 있다. 이름은 수송대(愁送臺)였고, 지금은 수승대(搜勝臺)다. 이름이 바뀐 해는 1543년이다. 바꾼 사람은 퇴계 이황이다. 바위가 있는 원학동 계곡이 워낙 명승인지라, 유람 떠난 이황이 바위를 보려 했으나 조정 부름을 받고 걸음을 돌렸다. 아쉬운 마음에 이황이 글을 써서 남긴다. "수송대(愁送臺)라는 이름은 슬픔(愁)이 담겨 있으니, '경치를 찾는다'는 '수승대(搜勝臺)'라 하시게." 수승대 근처 황산마을에 살던 선비 요수 신권이 대학자의 개칭 권유를 받아들였다. 신권의 큰 처남인 갈천 임훈은 내키지 않았다. 임훈은 이황보다 한 살 위다. 그래서 시를 썼다. "봄을 보내는 시름만 아니라 그대(이황)를 보내는 시름도 있네(不獨愁春愁送君)" 이황이 바꾸라 했던 '슬픔(愁)'이 두 번이나 들어 있었다.
은진 임씨 임훈 가문이 거창 신씨 신권 가문보다 거창 입향이 100년 앞섰으니, 임씨 문중에 수승대는 자기네 바위였다. 수승대 주변 황산마을에 살며 수승대에서 문중 제자들을 길렀으니 거창 신씨 문중에도 수승대는 문중 땅이었다. 사돈지간 시대에 개칭된 바위에 두 문중은 자기네 이름을 하나씩 새겨넣었다.

이름 석 자에 싸움이 한 번 벌어지고, 목숨까지 오갔다. 송사가 벌어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후손도 나왔다. "아름다움은 빼어나지만 두 집안의 비루함은 민망하다."(구한말 양명학자 겸 관료 이건창) "막대한 재산과 다수한 인명까지 희생하였으나 아모 해결을 엇지 못하며 지내"(1928년 1월 3일 자 조선일보) 일제강점기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유지이며 하천부지임. 그사이 바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위에는 여러 성씨 이름들이 자그마치 177개가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신씨와 임씨 이름이 각각 34개, 33개다. 그 모든 이야기가 수승대 바위 사방에 새겨져 있다.
기억 3 - 김운섭의 길고 아득한 기억
9·28 서울 수복과 함께 정부는 인민군 잔존 세력과 빨치산 토벌 작전을 세웠다. 잔존 세력은 덕유산과 지리산 일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9월 25일 토벌을 위해 육군 11사단이 창설됐다. 사단장은 중장 최덕신이다. 최덕신이 내건 작전은 견벽청야(堅壁淸野). 주요 거점은 견고하게 확보하고 적군 점령 가능성이 있는 타 지역은 들판 청소하듯 건물을 태우고 주민과 물자를 소개하는 작전이다. 거창과 산청, 함양 지역 담당 부대는 9연대 3대대였다. 연대장은 대령 오익경, 대대장은 소령 한동석이었다.
9연대장 오익경이 내린 작전명령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작전 중 미복구지대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 훗날 학살 사건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 작전명령은 바뀐다. '이적행위자로 판결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현지 집행하라.'(1951년 4월 18일 제1거창집단학살사건 국회특위조사보고 전문,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재인용)

3대대 작전지역인 거창, 산청, 함양 지역에서 민간인 살해와 물자 징발, 이념 교육을 하고 있던 인민군과 빨치산 세력은 대부분 산속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2월 5일 한동석의 3대대가 거창군 남쪽 신원면으로 진입했다. 적을 발견하지 못한 부대는 산청으로 이동했다. 2월 8일 신원파출소를 공비부대가 습격했다. 경찰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한동석 부대가 신원면으로 복귀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김운섭(75)은 내동마을에 살았다. 설을 쇠는 둥 마는 둥 하고서 김운섭 가족은 피란을 가야 했다. 아버지는 국군에 징발돼 짐꾼으로 끌려갔다. 엄마 손을 잡고, 형 손을 잡고, 동생은 엄마 등에 업혀서 산 아래 있는 청연마을로 피란을 갔다. 운섭은 아홉 살이고 여동생 운자는 두 살이었다. 눈이 흠뻑 내린 추운 날이었다. 그가 말했다. "아침이 됐는데, 군인들이 불방망이를 들고 들어와서 집을 불 지르고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나오라 이거야. 총을 막 팡팡 헛방을, 공포를 쏘아가면서. 막 군인들이 에망총(M1)으로 막 때리면서 빨리빨리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야." 청연마을 주민 89명 전원이 산 아래 논으로 끌려갔다. 기억이 이어진다.
"발이 시리니까 맨발로 끌려 나오니까 발만 움켜쥐고 맨땅에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산 것 같아. 사람이 총을 쏘니까 막 내 위로 막 엎어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막아줬어. 어머니는 저쪽, 우리 형은 요쪽. 피만 위에서 내리쏟아진 거 그것만 덮어 썼지. 그냥 위에서 막 뭐 넘어지니까 막 피가 입으로도 눈으로도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피가. 사람의 피가 참 냄새가 지독해. 어째 그런고. 그래도 거기서도 냄새가 지독하단 생각은 들어, 그래도." "아이들은요?" "엄마가 업은 데서 벗겨져 나와서 눈을 기어다닐 거 아니야. 그건 총알이 아까운가 군홧발로…."
그 아침, 얼어붙은 논에서 84명이 죽고 아이 다섯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1차 학살 사건이다. 왜 끌어내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름과 나이를 묻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견벽청야 작전은 완벽했다. 김운섭이 살던 내동마을에서 하루를 숙영한 부대는 다음 날 대현리, 와룡리, 중유리 마을을 불태우고 가축과 식량을 징발했다. 그리고 끌고 가던 주민 100여 명을 탄량골 골짜기에 몰아넣고 총을 쏘았다. 100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았다. 3대대는 시신을 나뭇가지로 덮고 기름을 끼얹어 불태웠다. 그리고 신원면 곳곳에서 끌고 온 주민 1000여 명을 신원국민학교 교실로 몰아넣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인공가를 불러봐라, 애국가를 불러봐라'라고 요구하며 이적행위자를 분류했다. 이튿날인 11일 이들은 학교 뒷산 박산골 골짜기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517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았다.
사건 한 달 뒤인 3월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중목이 국회에서 거창 사건을 폭로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 진상조사단이 파견됐다. 군에서는 공비로 변장한 부대원들을 동원해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조사는 무산됐다. 외신으로 보도되고,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11사단장 최덕신이 사건을 인정했다. 관계자들은 1951년 12월 15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전원 1년 뒤 특사로 풀려났다.
그때 밝혀진 사망자가 719명이었다. 15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이 넘는 364명이었다. 517명이 희생된 박산골은 3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다. 그사이 3대대장 한동석은 유골 가운데 작은 유골 100여 구를 추려 홍동골에 암매장했다. 1954년 통제가 풀리고 거창 주민들은 박산골을 발굴해 큰 유골은 남자, 작은 유골은 여자로 분류해 집단분묘를 만들었다. 손도장과 함께 발견된 1명을 빼고 전원 신원 불명이다. 암매장된 어린이들은 유골 없이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다. '小兒合同之地(소아합동지지)'. 묘가 아니라, 아이들의 '땅'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1960년 도비(道費)로 유족들은 분묘 앞에 위령비를 세웠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틀 뒤 유족들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구속됐다. 이들이 세운 위령비는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족들 손으로 글귀를 정으로 쪼아내고 땅에 파묻었다. 1988년 유족들은 이 위령비를 다시 땅에서 끄집어냈다. 정으로 글자가 파진 그 상태 그대로 뉘어놓았다. 청연마을 학살에서 살
아남은 김운섭이 말했다. "나라에서 파묻었으니, 나라에서 다시 세워라."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거창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다. 2004년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건립됐다. 그해 2월 5일 거창에서 빠져나간 한동석의 3대대가 산청에서 벌인 작전은 아직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 또한 희생자가 700명이 넘었다. 다시 서럽지 않도록, 기억해둔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